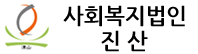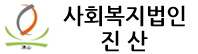ㆍ작성일 : 25-08-22 09:33
| <열린세상> 경험 멸종시대 '사회복지시설 인간다움' 다시 묻다 | |
|---|---|
| 글쓴이 : 관리자 | 조회 : 282 |
| | |
|
<열린세상> 경험 멸종시대 '사회복지시설 인간다움' 다시 묻다 김용권 사회복지법인 진산(津山) 이사장·국제학 박사 육체·정신 잠식하는 디지털기술 '사유하는 복지' 실천해야 당신은 계단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 에스컬레이터인가, 계단인가. 통계에 따르면 단 2%만이 계단을 이용한다. 대부분은 편리함을 택한다. 그러나 그 편리함은 곧 습관이 되고 습관은 몸과 생각을 무디게 만든다. 미국인 70%가 과체중이고 한국 남성 비만율도 매년 증가 추세다. 이는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다. 편리함이 육체뿐 아니라 정신까지 잠식하고 있다는 신호다. 이러한 흐름은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분명히 감지된다. 과거에는 관계 맺음, 소통, 신뢰가 돌봄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것이 시스템화 되고 효율화 되며 인간적인 접근은 '리스크 관리'라는 이름으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돌봄은 보고서가 됐고 상담은 기록으로 감정의 흐름은 절차 속에 갇혀 버렸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례기록은 자동화 되고 CCTV는 돌봄의 증거가 되며 상담은 정형화된 지표로 관리된다. 디지털 기기는 업무의 속도를 높여줬고 행정은 간편해졌으며 일정한 표준화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질문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가 과연 사회복지 이용자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다운 돌봄을 기계적 관리로 대체하고 있는가. 문화비평가 크리스틴 로젠은 '경험의 멸종'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더 이상 경험으로부터 현실을 배우지 않는다. 기술이 제공하는 가상의 체험이 우리의 현실을 대체하고 있다." 이 말은 단순한 사회평론을 넘어 복지 현장의 현실에 깊이 스며든 말이다. 돌봄이란 본래 '직접 경험'을 통해 신뢰를 쌓고 감정을 나누며 상호작용으로 회복을 돕는다. 그런데 우리는 점점 '직접'을 피하고 '간접'을 선호하고 있지는 않은가. 더욱 심각한 건 이러한 기술적 접근이 어느새 '돌봄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효율, 속도, 비용 절감이 우선 되면서 서비스는 매뉴얼화 되고 사람은 '관리 대상'으로 전락한다. 보고서에는 정량적 수치가 남지만 정작 이용자의 얼굴은 기억 속에서 희미해진다. 정해진 절차는 복지의 틀을 잡아주지만 때로는 돌봄의 온도를 빼앗는다. 기술은 인간을 돕는 수단이지 인간을 대체하는 주체가 돼선 안 된다. 사회복지시설은 더욱 그렇다. 손을 잡고 눈을 맞추고 마음을 함께하는 돌봄이야말로 회복의 시작이자 끝이다. 경험의 멸종은 피할 수 없는 미래가 아니라 인간이 선택하는 현재의 결과다.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은 투표권보다 소셜미디어를, 감각기관보다 스마트폰을 택한다. 어떤 조사에서 절반 이상 청소년이 "후각을 잃는 대신 스마트폰을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기술이 감각, 판단, 심지어 인간관계 질서까지 재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 시대일수록 사회복지시설은 '느림'과 '기다림'의 가치를 지켜내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복지 철학이 아니라 인간 존엄을 지키는 일이다. 사회복지법인 진산이 운영하는 시설은 효율성과 관리 중심의 시스템 속에서도 '인간 중심'의 복지 철학을 지켜나가고자 한다. 단지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존엄의 회복을 돕는 동행자가 돼야 한다. 보고서보다 사람을 먼저 보고 매뉴얼보다 관계를 중시하며 한 사람의 삶을 위한 '사유하는 복지'를 실천해가야 한다. 나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묻는다. "지금 이 돌봄은 충분히 인간적인가" "우리는 이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는가" 기관의 운영이 아무리 효율적이라도 그 안에 감정과 존엄, 공감이 없다면 그것은 복지가 아니다. 우리 시설이 그런 물음을 잊지 않는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감정이 배제된 효율은 관리일 뿐이며 돌봄은 '일'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시설은 가장 연약한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끝까지 인간적인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느리고 번거롭더라도 직접적인 관계를 선택하고 기다림을 감수하는 기관이야말로 진정한 복지의 길을 가는 곳이다. 기술은 우리를 도와야지 대신 살아줘선 안 된다. 우리 손끝에서, 말끝에서, 눈빛과 마음에서 회복이 시작된다. 그 회복은 표준화된 지침이 아닌, 개별적 경험과 관계 속에서 비로소 살아난다. 그것이야말로 인간다움을 지켜내는 길이며 우리 모두가 여전히 살아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
|